“형, 이새끼 또에요. 이번엔 간판집 사기쳤데.”
을지로 커피숍.
바이럴 대행사 후배 민성이, 폰을 내밀었다.
사기, 잠적, 블랙컨슈머, 실명 박제.
정리된 구글 스프레드시트.
익숙한 아이디.
나였다.
민성은 나를 모른다.
나와 함께 일했던 적은 없지만,
‘그 인간의 과거’를 추적 중이란다.
나는 그냥… 웃었다.
그리고 커피에 남은 거품을 휘저으며 입을 열었다.
> “그 새끼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줄까?”
---
2년 전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카페 브랜딩 건이었다.
작은 창업 카페, 디자인과 마케팅까지 풀 패키지를 원하던 클라이언트.
그녀는 대표가 아니었다.
대표의 여자친구이자, 실질적 운영자.
> “예산이 많진 않은데… 혹시 150만 원 안에서 가능할까요?”
150이면 무조건 적자였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해버렸다.
“한번… 잘해보고 싶다.”
---
그녀는 따뜻했고, 똑똑했고,
무엇보다
내가 해주는 모든 일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 “이 피드 너무 예뻐요. 진짜 고맙습니다.”
“아, 대표님은 뭐 몰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는 돈보다 사람이 고팠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밤샘도 피로하지 않았다.
---
그러다 어느 날, 대표가 전화를 걸었다.
> “디자인 다 나온 거잖아요? 나머지 잔금은 솔직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있었어요.”
이미 간판 시공도 들어갔고,
SNS 콘텐츠도 업로드 중이었다.
계약서에 '단계별 납입' 조항은 없었다.
결국, 잔금 120만 원이 날아갔다.
그녀에게 따져 물었다.
그녀는… 나를 피했다.
---
그때 배운 교훈 하나.
"계약서 있어도 못 받는 돈은 못 받는다."
그 후로 나는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저가 견적을 들고 클라이언트에게 접근했다.
> “브랜딩 풀패키지 180에 해드릴게요. 블로그, 인스타 스레드 1년 운영 포함.”
눈 돌아간 소상공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계약금 50만 원만 받고, 일은 '착수 전 상황'으로 밀었다.
요구사항 복잡하다며,
브랜드 방향이 계속 바뀐다며,
‘정리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손을 뗐다.
실제 피해자 중 하나는
블로그 후기까지 남겼다.
> “XX마케팅, 조심하세요. 선금 받고 연락 끊겼습니다.”
나였고,
나는 고소당하지 않도록 때때로 사업자를 폐업 후 재신청 하기도 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이메일 주소도 변경했다.
---
1년 뒤.
그녀가 연락을 했다.
> “혹시… 여기, 기억하시나요? 제가 다시 가게를 인수했어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사실 저도 뒤통수 맞았어요. 저, 그 사람한테 돈 뜯기고… 헤어졌거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만해요. 저도… 그 뒤로 많이 달라졌어요.”
> “혹시 다시 저랑 일 해주면 안 돼요?”
잠깐,
정말 잠깐
예전 감정이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이제,
사기꾼이었다.
다시 똑같은 눈을 마주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
후배 민성이 물었다.
> “형은 그 인간 어떻게 알았어요?”
“…일 좀 같이 한 적 있어.”
> “진짜 개쓰레기죠? 양심도 없나 봐요.”
나는 그 말에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카페가 검색창에 자동완성으로 떴다.
‘@yoo.bakery’
아직 운영 중이었다.
피드엔 매일 빵 사진과 따뜻한 글귀가 올라왔다.
나는 조용히,
메일함에 저장된 ‘정상 견적서’를 열었다.
그녀에게 주려 했던,
하지만 끝내 보내지 못한 그 견적서.
보낼까, 말까.
아니, 보내봤자다.
그녀는 진심을 기억하겠지만,
나는 이미
견적서보다 거짓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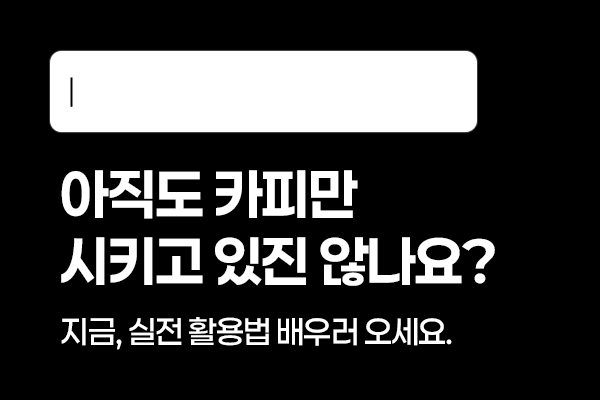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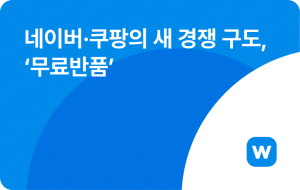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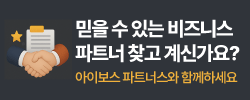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송디AI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